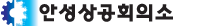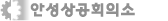|
지구를 지키는 ‘칭찬 인센티브’
한경에세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원도 고랭지에서 자란 가을 배추는 김장 재료 중 으뜸으로 친다. 해발 600미터 이상 고지대의 서늘한 날씨가 일상이기에 배추의 아삭하고 단단함이 단연 오래간다. 다만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랭지도 서늘한 날씨를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더운 날씨에 작황이 좋지 못해 가격이 부쩍 오른 쪽파나 무, 고춧가루에 선뜻 지갑을 열기 쉽지 않았다. 올해 김장 김치는 어디서 조달할(?)지가 밥상 토크의 단골주제다. 기후변화가 산업계 부담을 넘어 한국인의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는 모습이다.
기후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주 지구촌 대표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초회(COP29)에 모여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기후변화는 ‘가짜 경고’(hoax)라 발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지구촌 온도를 1.5도 낮추자는 야심찬 파리협정(COP21)에 위기의식이 확산됐다. 지구촌이 2035년까지 최소 연 1조3000억 달러의 기후 재원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분담 방식을 놓고 충돌을 겪었다.
인공지능(AI) 기술 선점경쟁도 치열해 지면서 필요한 에너지도 많아졌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를 구동하고 서버의 열을 식히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자 탄소중립보다는 ‘AI 선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하다.
마치 탄소중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듯한 딜레마 상황이다. 그래도 탄소중립을 해야 할까? 결론은 ‘해야 한다’다. 다만 정책의 균형 추를 바꿔보면서 해야 한다‘다. 탄소 다배출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줄입시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개인이 만들어낸 탄소감축 실적에 ‘참 잘했어요’ 크레디트을 부여하는 기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주체들은 나무심기, 전기 만들기, 플라스틱 재활용하기, 대체육 소비하기 등을 통해 크레디트를 쌓고, 이를 탄소감축이 필요한 기업에 팔 수 있다. 크레디트를 판 경제주체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크레디트를 산 기업은 할당량의 일정부분을 상쇄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산림 복원으로 탄소를 제거하는 스타트업과 계약을 체결하며 270만t의 탄소 상쇄에 나섰다. 개시 3년 후부터 제거된 탄소만큼 크레디트를 받는다. 구글, 메타 등의 연합도 2천만t의 자연기반 탄소 제거 크레디트를 구매키로 했다. 요컨대 자발적 탄소시장이 뜨겁다. 맥킨지는 “2030년 자발적 탄소시장은 최대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중립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것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크레디트로 보상을 얻기 위해 지구촌 지키기에 나서는 전국가적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 불현듯 어린 시절 칭찬 스티커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용돈으로 바꿔주던 삼촌이 생각났다.
|